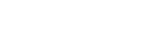이 웃 들
시 / 김해자
한 달여 비워둔 집
엉거주춤 남의 집인 양 들어서는데 마실 다녀오던
아랫집 어머니가 당신 집처럼 마당으로 성큼 들어와
꼬옥 안아주신다 괜찮을 거라고
아파서 먼 길 다녀온 걸 어찌 아시고 걱정 마라고
우덜이 다 뽑아 김치 담았다고 얼까 봐
남은 무는 항아리 속에 넣었다고
평상을 살펴보니 알타리 김치통 옆에 늙은 호박들 펑퍼짐하게 서로 기대어 앉아 있고, 항아리 속엔 희푸른 무가 가득, 키 낮은 줄엔 무청이 나란히 매달려 있다. 삐이이 짹짹, 참새떼가 몇번 나뭇가지 옮겨 앉는 사이, 앞집 어머니와 옆집 어머니도 기웃하더니 우리 집 마당이 금세 방앗간이 되었다. 둥근 스텡 그릇 속 하얗고 푸른 동치미와 살얼음 든 연시와 아랫집 메주가 같이 숨쉬는 평상, 이웃들 손길 닿은 자리마다 흥성스러운 지금은, 입동 지나 소설로 가는 길목
나 이곳 떠나
다른 세상 도착할 때도
지금은 잊어버린,
먹고사느라 잊고 사는 옛날 내 이웃들 맨발로 뛰쳐나와
아고 내 새끼 할 것 같다 엄마처럼 덥석 안고
고생 많았다 머나먼 길 댕겨오느라
토닥토닥 등 두드려줄 것 같다
참새떼처럼 명랑하게 맞아줄 것 같다
 |
| 사진=cafe.daum.net/sykch |
* 김해자의 시 ‘이웃들’은 <녹색평론> 2020년 1-2월호(통권 170호)에 실렸다. 시 같지 않은 시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삶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따스함을 나누다 가는 것이다. 내용이 소박할수록 더욱 좋다. 내로라하는 시인들의 시에도 분명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김해자와 같은 조용한 시인의 시에도 진한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 시는 운율의 문학이라고 했는데, 김 시인의 시는 마치 산문과도 같다. 그러나 시에 담겨 있는 심상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병으로 인해 입원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온 집, 이웃들이 빈 집을 그냥 두지 않고 내 집처럼 정돈을 했다. 김치, 알타리, 호박, 무청… 거기에 동치미와 연시까지… 농촌의 겨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한 폭의 풍물화이다.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갈 때도 한 식구처럼 반갑게 맞아 주는 이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시인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하나의 소망으로 다가온다.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심이 흐트러질 때, 김해자의 시 ‘이웃들’은 위로가 된다.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 폐렴의 도시 우한(武漢)을 벗어나 입국하는 동포들에게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며 트럭과 트랙터로 대로를 막고 있단다. 내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할 때 존엄성에 값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해자는 이것을 시로 말해 주고 있다(耳穆).
취재부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