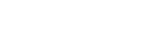-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
|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곡우(穀雨)이다. 농경 사회일 때, 이 무렵 못자리 준비로 볍씨를 담궜다. 싹이 쉽게 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농군의 지혜가 엿보인다.
날씨가 초여름 같다. 기온도 30도가 넘을 것 같다는 예보다. 오늘은 4.19혁명 기념일이기도 하다. 매년 의미를 새기고 있다. 1960년의 일이니까 벌써 64주년이 된다. 세월이 빠르다.
10여 년 전 이날이 떠오른다. 그날은 폭설이 내려 대지를 하얗게 수놓았었다. 내 기억으로는 가장 늦게 내린 폭설에 해당한다. 자연의 섭리에 대한 시대의 질투인가 생각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4.19의 의미는 대단했다. 각 대학별로 행사가 마련될 정도였으니까. 4Km 단축 마라톤에 참여하기도 했다. 학생이 주도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린 이유가 클 것이다.
이때에도 대통령은 상식을 벗어난 통치를 했다. 사사오입 개헌 등 웃음거리를 생산해 냈다. '독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했다. 불의가 횡행했다. 보다 못해 학생들이 나선 것이다.
4.19는 그 명칭부터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다른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혁명이 분명했다. 하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측에선 '혁명' 대신 '의거'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무덤덤하지만 학생들의 젊은 피로 '쟁취'한 4.19 혁명이다.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경찰의 발포로 학생 186명이 생명을 잃었고, 6,02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대학 교수들이 4월 25일 '學生(학생)의 피에 報答(보답)하라'는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합류했다. 철부지 학생들의 일탈로 호도하던 정권에 치명적이었다.
이때 이승만 정권의 4.19 대항 논리는 '학생이 뭘 안다고'와 '공산당의 배후 조종'이었다. 이른바 '철부지론'과 '색깔론'이다. 대학교수들의 시위합류는 정권의 논리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
| 1960년 4월 25일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학생들의 시위에 동참했다(사진=나무위키) |
그 이튿날(26일)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권좌를 내놓은 것이다. 같은 달 이승만은 극비리에 하와이로 망명 길에 올랐다. 결말이 누추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뉴라이트 세력이 정권과 손을 잡은 이후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역사가 헝클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역사는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있다. 독재자가 민중의 힘에 굴복해 쫓겨난 사실을 외면하고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 국부(國父)라고 치켜 세우는 이들이 있다. 그 틈을 노려 '건국 전쟁'이라는 뉴라이트 영화도 나왔다.
역사는 일순의 감정으로 서술되는 게 아니다. 사실(fact)에 근거해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역사가 될 수는 없다.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의가 필요하다. 즉 찬성과 반대의 폭이 극소화되어야 한다. 이승만의 행적은 긍정보다 부정의 비중이 더 크게 자리한다. 그런데 건국 영웅을 만든다고?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옅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시 교수 데모단이 앞세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는 현재에도 살아 있다. 모판을 볍씨를 담그는 심정으로 오늘을 음미해야겠다.
발행인 gcilbo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