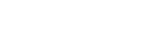-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
|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
현수막은 한자어지요. 현수막(懸垂幕)이라고 표기하더군요. 플랜카드 플랑카드로 곧잘 쓰고 있지만 외국어 표기법에 의하면 플래카드(placard)가 맞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플래카드 즉 현수막입니다.
기관과 단체에 애경사(哀慶事)가 있을 때 알리는 의미에서 현수막을 제작해 거리에 내겁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일로 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현수막 게시의 확대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가령 아무개 아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한다던가, 박사 학위 받은 것 축하한다던가... 얼마 전엔 이웃 마을 모씨(某氏)의 아들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축하한다는 것도 있더군요.
‘플래카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정치인들입니다.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명절 인사로 이 현수막을 애용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유용해서이겠지요.
무엇보다도 효용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경제성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구요. 즉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효과는 자신을 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지역구라는 뚜렷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현수막을 걺으로써 인사도 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의미도 있고...
명절 때만 되면 이런 사람들의 현수막이 홍수를 이뤄 ‘현수막 공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구요. 차라리 현수막 제작에 드는 비용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소리도 들리구요.
자치단체에서도 이것들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면 수거하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항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이런 현수막 게시는 어쨌든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고 봅니다. 과거 유신 독재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지요.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전달만 해도 잡혀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내용에 정부를 비판하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영락없었습니다. 가끔 대학 내 건물에 반정부 현수막을 내려뜨리고 데모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주동자들은 철창행이었지요.
현수막을 내걸고 데모를 주동한 학생뿐 아니었습니다. 글씨를 쓴 학생, 페인트·광목천·붓 등 재료를 사 온 학생들 나아가 그것을 판 사람들까지 줄줄이 불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으니까요.
 |
| 1987년 7월 전경의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고 이한열(20세) 학생의 장례식에는 많은 만장이 따랐다(사진=부산일보) |
그런데 탈출구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현수막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 때의 만장(輓章)이 그것입니다. 불의에 맞서다가 희생된 열사의 장례식 때 그 행렬은 가히 장관(?)이라 할만했습니다.
가령 1987년 1월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박종철이나 같은 해 7월 시위 도중 전경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장례식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만장 행렬이 길었지요. 경찰이 이것만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이 일반 시민들의 의사 표시 도구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DJ 정부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아무래도 군사 정권의 때를 벗지 못했다고 봐야지요. 그들이 군 출신이니까.
김영삼도 문민정부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만 군부 세력의 힘을 빌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언로가 그렇게 민주적이진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라고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DJ 정부 때 와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DJ 자신부터 군부 독재 세력에 목숨까지 앗길 뻔했잖아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때에야 비로소 집회 때 현수막을 당당하게 앞에 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운동 단체의 기자회견 때엔 현수막을 앞세우고 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때 장례식 만장을 막지 않았듯 DJ 때 기자회견장 또 집회의 현수막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로를 거친 현수막이 지금은 누구나 걸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리에 여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수거하면 왜 우리 것만 거둬갔느냐며 항의가 바로 들어온다네요.
이런 항의도 전혀 일리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불법 광고 현수막임에도 관(官)의 것, 정치인들의 것은 버젓이 걸려 있는데 자기들 현수막만 사라졌으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요.
 |
|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언석 의원에게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플래카드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거리에 내 걸렸다. |
요 며칠 사이 몇 개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 사무처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김천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 탈당을 보신책(保身策)으로 보는 비판이 있었지요. 소낙비를 피하고 보자는….
김천 관내의 한 단체에서 ‘송언석 국회의원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김천 곳곳에 내 걸었습니다. 일방통행이 구조화된 지역에서 역행하는 몸짓이어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지요.
민주주의란 다양함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제도잖아요. 그 점을 생각할 때 다른 소리와 주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 주장이 나와 내가 속한 그룹의 이익을 넘어 국민 다수를 위해야 한다는 것. 내 거는 현수막도 이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재 lmj2284@hanmail.net